‘늙으면 몸도 쇠약해진다/ 병들어 광택이 없고/ 피부는 늘어지고 살갗은 쭈그려드니/ 목숨이 다할 날 더욱 가까워지네.’ - ‘여는 글’ 첫 머리에서
해거름 길에 한 사내가 스스로에게 혹은 세상을 향해 읊어주는 노래다.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매사에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결기를 불태우던 한 시절이 있었다. 뻔히 보이는 것을 보려하지 않고, 혹은 없다고 우기는 세상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그들을 이해시키고야 말겠다고 다짐하던 나날들. 기필코 이해하고 이해시켜야겠다는 치열함 대신에, 이제는 같이 보고 느끼면서 함께 공감을 나누고자 한다. 왜 그래, 라고 다그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힘겨움과 안타까움으로 지친 어깨들을 토닥거려주고, 마주 잡은 손으로 뜨거운 아픔과 따뜻한 슬픔을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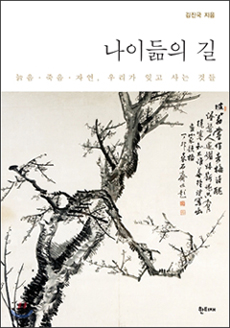
그토록 분노하고 아파하던 세상은 점점 더 벌거벗은 탐욕과 다툼으로 황량해지는데, 그의 목소리는 한결 깊고도 은근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이라는 광신자이기를 강요하는 세상에서, ‘늙음, 죽음, 자연,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 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법구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며 노래 한 대목에 곁들여 던지는 그의 첫 질문이다.
언제나 ‘젊음과 늙음, 삶과 죽음’ 중에서 양자택일만을 다그치는 아우성들. 좀 더 빨리, 좀 더 높이, 좀 더 빛나는 내일을 향해 치닫는 길에 거치적거리는 구닥다리들은 하루 빨리 걷어다가 한 구석으로 떼어놓아야 한다. 더디더라도 마땅한 ‘효과’보다는 바로 돈이 되는 ‘효율성’을 앞세워야 하는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태양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늘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해바라기가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그들의 성전에 자못 금과옥조로 모셔진다. 감당키 힘든 절망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들에게 던지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이라는 강을 건너면, 참을 수 없는 욕망을 부추기는 굉음으로 바뀌어 버리는 서글픈 자화상 앞에서, 그는 우리들에게 묻고 스스로 답을 한다. 존재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눈이 멀어버린 해바라기가 진정 우리가 바라던 모습이었던가? 외면한다고 없어질 그림자이고, 그림자 없는 허깨비 삶의 끝은 또 어딘가? 가장 심하게 눈이 먼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라지 않던가. 안간힘으로 뿌리치고 오직 앞만 보고 내달려온 길, 너무도 당연하여 도리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일러준다. 지상의 삶에서 젊음과 늙음은 공존해야 하고, 삶과 죽음 역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고.
‘자연은 우리에게 모습을 주었다. 또 우리에게 삶을 주어 수고하게 하고, 우리에게 늙음을 주어 편하게 하며, 우리에게 죽음을 주어 쉬게 한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삶을 좋다고 하면 스스로의 죽음도 좋다고 하는 셈이 된다. ( 『장자』 「대종사」 大宗師 )’ - ’1장 나이듦과 늙음에 대하여‘ 25쪽에서
죽지 못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에 스스로 그렇게 좋은 죽음이 찾아든다. 그런 자연스러운 삶과 죽음의 길을 흩트리고 늙음을 불쾌한 불편함으로만 내몰아, 마침내 삶 자체마저 망가뜨리고야마는 모든 것들과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잔다. 바로 지금, 이 곳에서의 우리들 모습을 동서와 고금을 통하여 되비추어보고, 안팎에서 옥죄고 있는 것들의 불편한 뒷모습에 대하여 하나하나 되돌아보게 한다.
“세상 천지 이런 법이 어디 있노? 와 날 여 가다 놓고 못 나가거로 하노? 세상에 무씬 법이 이런 법이 있노. 보소, 우리 큰아자테 전화해가 날 좀 데려가라 카소. 죽어도 나는 집에 가서 죽을라느마……. 내가 여어서 죽으마 누가 끌어 묻어줄끼고?” - ‘3장 사라진 전통문화와 늙음’ 107쪽에서
함께 살아오던 가족들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그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의 외진 병실로 옮겨진 어느 노인의 애끓는 절규다.
곱게 나이 들어감과 추하게 늙어빠짐의 아득한 거리에서 그는 같이 아파하고 눈물 훔친다. 모질고 거센 물결 앞에서, 같은 이웃으로서의 안타까움과 그럼에도 지켜보아야만 하는 의사로서의 무력감이 함께 하는 풍경. 섣부른 탐욕으로 온통 망쳐버린 강가에서 토해내던 어느 시인의 탄식이 절로 들려온다. ‘물이 법(法)이었는데/ 법이 물이라 하네// 물을 보고 삶을 배워왔거늘/ 티끌 중생이 물을 가르치려 하네// 흐르는 물의 힘을 빌리는 것과/ 물을 가둬 실용화하는 것은 사뭇 다르네’ (함민복의 「대운하 망상」에서) 허겁지겁 깎아내고 가둬버린 강으로 외로운 주검들이 둥둥 떠다니고, 시멘트 범벅으로 발라버린 제방의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강물의 핏빛 신음 소리들. 이제라도 그 소리에 부끄럽게 귀를 열고, 망가지고 뒤틀린 강가에서 눈을 씻고서 스스로부터 되돌아 볼 일이다.
‘주름진 제 얼굴에도 꽃들이 하나 둘 피기 시작합니다. 향기가 없는 꽃입니다. 곱지도 않은 빛깔입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그 꽃들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제가 살아온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점점 그 꽃들이 정겨워지고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꽃 질 무렵이면 제 삶도 저물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 내 몸의 흔적은 없어질지라도 푸른 빛의 새 생명은 또 피어나겠지요.’ - ‘10장 자연과 인간’의 닫는 글에서
뜨겁던 젊음과 따스한 늙음이 다하고, 이윽고 죽음의 서늘한 평온이 깃드는 ‘나이듦의 길’을 그와 함께 고즈넉이 걷고 싶다. 그가 그토록 정겹고 소중한 모습으로 다시 찾은 꽃 한 송이를 길잡이 삼아서 말이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의 「그 꽃」)

[책 속의 길] 110
송광익 / 늘푸른소아청소년과 원장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광익 /『나이듦의 길 - 늙음ㆍ죽음ㆍ자연,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김진국 저 | 한티재 | 2013.9)
송광익 /『나이듦의 길 - 늙음ㆍ죽음ㆍ자연,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김진국 저 | 한티재 | 2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