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월3일)가 설이었다. 매스컴에서는 구제역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상 최대의 귀성인파가 이동할 것이라는 예보를 내보냈다. 얼마 전 타계한 소설가 박완서 선생의 말처럼 명절이 되면 “조상의 묘나 집안 내의 연로한 어른을 찾아뵙고 눈도장이든 몸도장이든 찍고 와야 사람 사는 도리를 다 한 것처럼 편안해”(「내 식의 귀향」『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28쪽)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설이나 추석이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이게 다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의 후손이기 때문인지???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운데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이라는 시가 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국어시간에 읽은 시이다. 숲 속에 난 두 갈래 길 가운데 풀이 많고 사람이 다닌 흔적이 적은 길을 택해 나는 그 길을 걸었고 먼 훗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회고하는 시이다. 같은 시인의 「눈 내리는 밤 숲 속에 멈춰 서서」와 함께 대학에서 영문과를 다녔던 내가 특히 애송했던 아름다운 시이다.
앞서 언급한 시처럼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다.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수도 있고 여럿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선택의 결과는 프로스트가 시에서 말한 것처럼 그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 졌”을 뿐이지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해 가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박완서 선생은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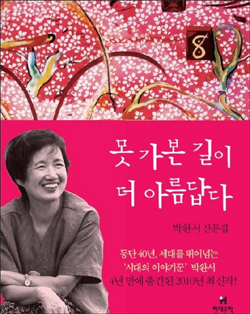
그때 대학은 출세에 유리하고, 돈 잘 버는 좋은 직장 구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라 “사회적 부조리를 비판하고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지성을 길러내는 데”(25쪽)이며 박완서 선생은 그런 곳에서 학문을 하고 싶었던 게 처음의 꿈이었지만, 6.25로 인해 그 꿈이 소설가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못가 본 학자의 꿈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작가의 직접적인 해명과는 달리 이 책의 전편을 흐르는 배경은 가난, 한국전쟁, 이데올로기 갈등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짜 같은’ 목숨을 잃은 외아들 오빠의 죽음과 그 죽음을 감내해야했던 노모의 고통, 그 고통을 곁에서 지켜봐야했던 딸의 심정, 남편 죽음과 외아들의 사고사 등을 겪으면서 ‘개인의 고통’과 ‘시대의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박완서 선생에게는 좀 더 평화로운 시대적 삶과 개인의 삶을 살고 싶었던 그런 처절한 서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현대문학, 2010)의「내 식의 귀향」끝머리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내가 살아낸 세상은 연륜으로도, 머리로도, 사랑으로도, 상식으로도 이해 못할 것이 천지였다.” 그런 세상을 여린 여성의 몸으로 ‘살아 온’ 것이 아니라 ‘살아 낸’ 것이 작가 박완서 선생의 삶인 것이다.
연보를 보면 박완서 선생은 1931년생이다. 그리고 80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이 연배의 사람들이 살았던 한반도에서 삶이란 일제식민지, 해방, 좌우갈등, 한국전쟁, 가난, 군사독재, 산업화, 민주화투쟁, 희생, IMF양극화로 이어지면서 말 그대로 지난한 삶을 고통을 견디듯이 살아 낸 것이 틀림없다. 거기다가 특별한 개인적인 고통까지 겪었다면 그 삶이 어떠했으랴. 그래서 그런지 박완서 선생은 이 책에서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소설가 박완서는 작품의 양으로나 문학적 수준, 그리고 작가로서 보여준 사회에 대한 정의감이나 너그러운 체세를 감안한다면 그는 단연 ‘국민작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작고하면서 남긴 말에 가슴이 찡했다. “가난한 문인들에게 부의금을 받지 말고 잘 대접하라”. 우리 문인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헤아리는 말이고 또 배려와 정이 넘치는 말이다. 문단 말석에 이름을 얹고 있어서 대부분 문인들의 곤궁한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에게는 어떤 근사한 명분이나 사회적 실체가 있는 유언보다 훨씬 진실하게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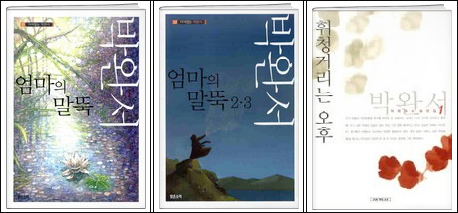
「엄마의 말뚝」이 증언하는 생생한 전쟁의 참화, 「휘청거리는 오후」와 같은 소설에서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탁월한 문체와 심리묘사 등은 박완서 소설의 장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에 펴낸 산문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현대문학, 2010)에는 이러한 소설적 특장과 인생을 보는 여든 노작가의 원숙한 시선이 어우러져 쉽게 만날 수 없는 문학적 향취를 독자에게 전해주고 있다.
산문은 소설이나 시와는 달리 직접적이면서도 간결한 문체적인 특징 때문에 작가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드러내는 데 장점이 있는 장르이다. 좋은 산문은 소설이나 시보다 훨씬 빛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국의 사상가 루쉰(魯迅)은 산문에 대해 ‘잡감雜感’이라 부르면서 소설보다 더 많은 글을 남기면서 잡감 쓰기를 애용하기도 했다.
근래 작고한 전우익 선생,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 법정 스님, 리영희 교수 등은 당대의 뛰어난 산문가였다. 박완서 역시 그들에 뒤지지 않는 좋은 산문가라는 사실을 이번에 펴낸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가 증언하고 있다. 좋은 문장을 남기는 시대의 높은 스승들이 자신이 왔던 곳으로 속속 ‘귀향’을 하고 있다.
불교 경전 금강경(金剛般若波羅密經) 의 ‘오고 감이여! 위의적정분(威儀寂靜分)’ 편에서 육조 혜능 대사는 “여래는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니고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앉는 것도 아니고 앉지 않는 것도 아니다. 눕는 것도 아니고 눕지 않는 것도 아니다. 행行, 주住, 좌坐, 와臥의 네 가지 위의威儀 중에 항상 공적空寂에 있는 것이 여래다” 고 말하고 있다.
이 말처럼 “깨달음의 세계는 태어나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죽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무엇에 의해 더렵혀지지도 않고 더렵혀진 것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며, 누가 사용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무엇을 더 가져 놓는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대로 있을 뿐이”(『금강경강의』300-301쪽, 김성규 지음, 자유출판사, 2010) 라고 해설하고 있다.
‘깨달음의 세계’는 이런 경지의 것이다. 자신이 선택한 종교와 상관없이 이 경구를 곰곰이 새기면서 설 연휴 동안 오고 가는 귀향의 공간에서, 시대를 증언하고 인간의 실체를 예리하게 증언했던 그러면서 깨달음의 세계를 열고자 했던 박완서 선생의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를 읽고 「내 식의 귀향」에 대해, 나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과 의미에 대해, 삶과 죽음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책 속의 길] ③
김용락 / 시인. 경북외국어대 교수. daegusc@hanmail.net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락 /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박완서. 현대문학, 2010)
김용락 /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박완서. 현대문학, 2010)